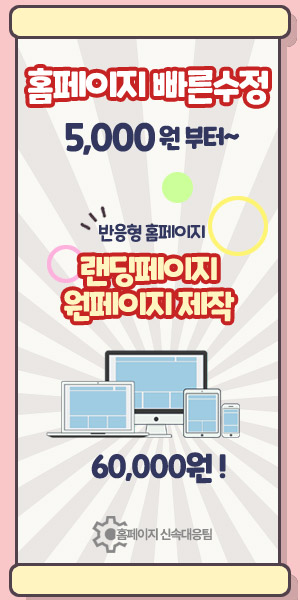[경제 인사이드] 받을 돈 ‘법적 효력’ 증거는?…똑똑한 ‘돈 거래’ 이렇게! / KBS뉴스(News)
페이지 정보
작성자 KBS News 작성일18-12-11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돈 빌려주고 속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돈 빌려 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상대가 돈을 안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돈 빌려 줄 때 차용증 써야 한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차용증 쓰자고 하면 괜히 상대를 못 믿는 것 같고, 법적인 효력 면에서는 차용증이 무조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차용증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나는 ‘증거’라고 내놓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또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자’는 증거인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안 빌려줬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진짜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하는 것은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돈을 빌려주었네 안 빌려주었네 하면서 다투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공증까지 해주지는 않으려고 하니까 만약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단순 공증이 아닌‘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판결받을 필요도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이 가능하므로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므로 만약 금액이 많다면 담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까진 아니더라도 자동차, 모피코트, 가방, 퇴직금도 1/2 등도 가능.
또 추후 가압류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뭔가요?
[답변]
차용증 쓸 때는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원금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짜, 언제 갚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채무자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고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찍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돈만 잘 갚아준다면 여유 있을 때 돈 빌려 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안 갚을 때잖아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것은 사기 혐의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간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일단 사기죄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변제가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갚아야 선처가 됩니다.
돈 빌려 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파산 신청할 때까지 있었던 상대방의 모든 채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줄 돈까지 포함해서 파산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 이름과 주소, 금액 등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준 다음 ‘이의’ 여부를 말하라고 하므로, 이때 상대방의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잘 소명해도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파산신청은 받아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내 채권은 단순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